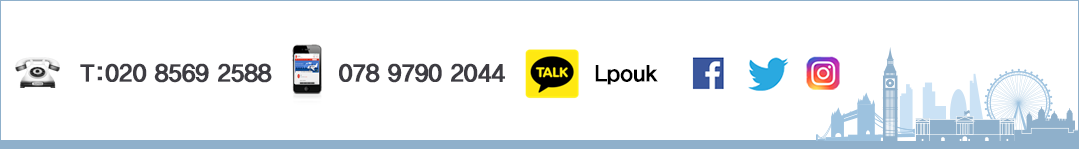9년 만에 이사를 왔다
이사를 오니 좋다
넒고 깨끗한 창고와 사무실,
사무실의 전등 불빛에 눈이 부실 정도다.
새로운 계약도 예전처럼 건물 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서류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
어느 누구는
예전의 사무실과 비교하면
비가 새는 달동네 다락방에서
서민형 아파트 당첨이 되어 이사 온 것 같다고 표현을 하니
내가 느끼는 환경변화에서 오는 감정의 느낌이 다양해 진다.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화장실도 2개,
깨끗한 거울도 있고 부엌도 있고 보일러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전기 히터를 책상 아래 두고 언 손을 녹이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이지 않아도 되고
추운 날씨에 화장실 파이프가 얼어서 맥도날드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회사 간판 작업을 멀리서 보니, 나 혼자 울컥한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도,
그 환경을 더 빨리 만들지 못한 미안함이 떠나간 동료에게 든다.
물론 그들이 예전 사무실이 ‘비가 새는 다락방’ 이라는 이유로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9년 동안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짧게 혹은 길게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서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었고
개인의 ‘비자문제’, 일에 대한 ‘만족감’, 본인 ‘기대치 이하’의 월급과 ‘행복지수’를 위해
떠나 한국과 영국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그들에게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0
0